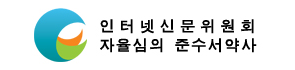임재현 관세청장, 시내면세점 국산품 해외 온라인 판매 허용
- 대량구매상인에 휘둘리던 면세점, 면세역직구 허용으로 방향전환 가능
현장인도도 대폭적으로 개선해 국내 내수 시장 부정적 영향 차단
준비기간 거쳐 3월 말 또는 4월경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측
 |
| ▲ 사진=관세청 제공 /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에 참석한 임재현 관세청장, 2022.01.14 |
코로나로 약 2년간 대량구매상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던 국내 면세점 업계에 희소식이 전해들었다. 14일 임재현 관세청장은 서울세관에서 서울시내면세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해외 거주 외국인들에게 국산품을 판매 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부분 논의가 이뤄져 왔던 일명 ‘면세품 역직구’ 모델이 드디어 정부차원에서 공식 허용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국내 면세점은 외국인의 방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세계 1위 면세점 시장을 유지해오던 국내 면세업계는 2020년에는 중국에 턱밑까지 쫓겼고 2021년에는 큰 격차로 밀리기 시작했다. 관세청은 코로나가 시작된 후 3개월만인 2020년 4월 외국인의 구매수량 제한을 풀고 ‘제3자 반송’ 정책과 재고 면세품의 국내 수입 신고후 내수 판매 허용 등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했다.
 |
| ▲ 사진=관세청 제공 /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시내면세점 CEO 간담회, 2022.01.14 |
특히 예측불허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초기에 업계 지원책으로 선택한 외국인의 구매수량 제한 폐지 정책은 중국인 대량구매 상인들에게 국내 면세점이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다. 이후 국내 면세업계는 중국인 대량구매 상인에 오히려 종속되는 모양으로 구조적인 기형화까지 초래되는 상황에 빠졌다. 2021년 들어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액은 2020년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극도로 악화돼 사실상 손해보고 물건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지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이 향후 언제쯤 가라 앉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나 다른 종류의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초래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전후로 기형화된 국내 면세산업의 근본적인 기형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면세품 역직구’ 모델이다.
일단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시내면세점을 통해 판매되는 국산 면세품에 한해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오늘 논의에서 국산품의 현장인도 정책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면세점에서 국산품에 한해 외국인이 구매시 구매와 동시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가 현장인도 제도다. 관세법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특례)를 근거로 한 내용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은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구매와 동시에 물건을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국산 면세품이 대량 구매 후 내수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와 세금포탈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청이 한국을 방문했다 출국하기 위한 항공권을 구매한 후 면세품을 구입하고 곧바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외국인 여행객과 유학생등을 대상으로 ‘우범여행자’로 선별해 면세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중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장이 더욱 기형적으로 변하게 됐다. 그 이후 국매 면세업계는 사실상 대량구매 상인들에게 매출액이 좌지우지되고 그 때문에 영업이익율이 곤두박질 치게 된 것이다.
국내 면세업계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면세품 역직구’ 즉, 코로나로 방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구입 하는 방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후 이를 국제우편 등으로 발송해 주는 온라인 판매 허용정책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편으론 국산품의 현장인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론 해외 거주 외국인의 국내 시내면세점 국산품 구입이 가능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세부 시행방안 수립과 업계의 사업모형 발굴 및 시스템 구축등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2~3개월의 도입 준비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2020 국감이슈 ③]관세청, ‘면세품 역직구’ “관련 유통업계 피해 우려” 난색2020.10.28
- 관세청, 면세점 역직구 “검토 신중해야”…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드러내2020.10.14
- [정책] 관세청 ‘역직구’ 지원 나서, 통관 쉽게 바꾼다2019.04.11

- 김재영 / 편집국 기자 hasub1@trndf.com 이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 TR&DF 편집국 기자 김재영입니다.
태그
- #관세청,
- #관세법,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 #역직구,
- #온라인판매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 북극항로 위해 부산에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 인사·동정
- 한국면세점협회, 11대 협회장으로 신라면세점 조병준 부사장 선임
-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 Promotion
- 신라免, 새해 맞이 최대 규모 ‘경품 프로모션’ 진행
-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 김재영
2024-06-17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 김재영
2021-06-25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 김재영
2021-08-05